"로켓과 우주는 내면의 초월의지"…81세 NASA 연구원이 神 믿는 이유 [백성호의 현문우답]
미국 항공우주국(NASA)에는 ‘발명가 명예의전당’이 있다. 역대 NASA 과학자들 중 아주 특별한 발명 공로가 있는 이들이 선정된다. 챗GPT에게 그 명단을 물었다. 맨 위에 1순위로 올라온 사람의 이름이 ‘최상혁’이었다. 올해 81세, NASA의 현역 과학자(수석 연구원)이다.
최 박사가 지금껏 발명한 건수만 181개. 현재 발명 중인 것을 합하면 무려 200개가 넘는다. NASA 과학자들의 발명 건수는 대개 10개 안팎이다. 그가 명예의전당에 오른 이유다. 오랜만에 한국을 찾은 최 박사를 지난달 23일 서울 숙소에서 만났다. 최 박사에게 로켓과 우주, 과학과 자유를 물었다.

Q : 고향이 어디인가.
A : “강원도 춘천이다. 춘천 북쪽의 강 건너 동네였다. 거기에 미군 부대가 있었다. 어릴 적 집안은 부유했다. 그런데 한국전쟁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어머니는 미군 군복을 가져다 세탁했다. 집안의 생계였다. 나는 세탁물을 들고서 미군 부대를 들락거렸다. 그러다 내 삶을 바꾸는 일이 생겼다.”
Q : 어떤 일이었나.
A : “미군 부대 안 천막극장에서 영화를 봤다. 발사대에서 로켓이 날아가더라. 처음 봤다. 저런 것도 있구나. 너무 멋있더라. 그때부터 로켓 개발하는 과학자가 되고 싶었다.”
그는 미군을 통해 로켓에 대한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다. 사진도 모으고 글도 모았다. 중학교 1학년 때였다. 그걸 보던 미군이 편지를 써보라고 했다. 미국 오하이오주에 있는 공군 기지였다. 서툰 영어로 두 줄짜리 편지를 썼다. ‘I am crazy for rocket. I need information.’(로켓이 미치도록 좋다. 정보가 필요하다) 놀랍게도 답장이 왔다. 책 한 권 두께의 자료와 함께 왔다.
Q : 그 자료로 무엇을 했나.
A : “나는 미국에서 온 자료를 갖고 실제 로켓을 만들었다. 직접 화학약품도 샀다. 매뉴얼도 없었다. 혼자 생각하며 시도했다. 고등학생 때는 그 로켓이 하늘을 날았다. 물리 선생님과 함께 소양강 강가에서 쏘았다. 발사대를 떠난 로켓은 수백 미터까지 올라갔다.”

1960년대 초에 인하공대에서 로켓을 개발해 쏘아 올린 적이 있었다. 물리 선생은 거기로 진학하라고 했다. 인하공대 기계공학과에 입학한 그는 로켓 동아리에 들어갔다. 그런데 사고가 터졌다.
“대학 3학년 때였다. 로켓을 만들다가 폭발했다. 오른손을 로켓에 대고 있었는데, 폭발과 함께 손목까지 날아갔다. 오른쪽 청력도 그때 거의 상실했다. 나는 오른손잡이였다. 사고 이후로 왼손으로 모든 걸 해야 했다. 자취를 했으니 밥도 왼손으로 짓고, 강의 때 노트 필기도 왼손으로 해야 했다. 당시 사귀던 여자 친구도 떨어져 나가더라.”
처음에는 분노했다. 청춘이 분했고, 과학자의 꿈이 분했고, 인생이 분했다. 교수들은 그에게 과학자보다 교사가 되라고 했다. 오른손이 없으니 불리하다고 했다. 결국 졸업 후에 인천 송도고등학교 물리 교사가 됐다. 그런데 과학자의 꿈을 포기할 수 없었다. 그는 원자력연구소를 거쳐 미국 오리건주립대로 유학 갔다.
Q : 그때도 로켓을 좋아했나.
A : “물론이다. 로켓이나 우주과학에 대한 열망은 한순간도 버린 적이 없었다. 무한한 자유를 향한 내 안의 초월 의지. 그게 내게는 로켓과 우주였다.” 수학과 기계공학으로 석사, 기계공학 박사 학위를 받은 뒤 최 박사는 NASA에 들어갔다.
Q : 이런 말이 있다. ‘NASA는 지구상에 없는 걸 개발한다.’ 사실인가.
A : “그렇다. NASA는 우주와 항공, 두 분야다. 이걸 위해 수만 가지 분야가 개입된다. 심지어 심리학자들까지 있다. 지구에서 화성까지 가는데 편도로 6개월이 걸린다. 좁은 자동차에서 6개월간 운전한다고 생각해보라. 우주 비행사의 마음이 어떻겠나.”
Q : NASA는 얼마나 멀리 내다보고 일하나.
A : “1990년에 ‘비전 2020’이 있었다. 30년 내다보고 일했다. 보통은 10년 정도 내다보고 일한다. 항공기도 NASA에서 처음 개발했다. 그 기술을 보잉 등 민간 회사에 팔았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다닌다.”
Q : 81세에 현역에다 수석 연구원이다. NASA에는 정년이 없나.
A : “정년이 없다. 지식재산권 문제도 있고, 연구 경력을 소중히 여긴다. 일반 연구원은 소속된 프로젝트에 따라서 움직인다. 수석 연구원은 다르다. 연구 분야도 자기 스스로 정한다. 상당한 자유가 주어진다. 나는 지금 새로운 로켓 추진체와 핵융합 기술을 맡고 있다. 양자기술위원회 소속이기도 하다.”
Q : 과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A : “지식의 포로(Hostage of knowledge)가 되면 안 된다. ‘아느냐, 모르느냐.’ 이게 지식이다. 지식은 과거에 속한다. 이건 1차원이다. 그다음에 ‘하느냐, 못하느냐’다. 정주영 회장이 말했다. ‘너 해봤어?’ 사람이 무언가 하려고 노력하면 지혜(Wisdom)가 생겨서,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길이 열린다. 이게 2차원이다. 현재다.”
Q : 그럼 미래는 무엇인가.
A : “마지막 3차원은 예지(Intelligence)다. 미래다. 이 우주에 대해 우리가 아는 건 5%도 채 안 된다. 그럼 우주의 숨겨진 지식(Hidden archive)을 어떻게 우리 현실로 가져올까. 그게 궁리와 사유와 명상이다. 그걸 통해 자기 프레임을 깰 수 있어야 한다. 이건 인류에게 아주 중요한 거다.”
한국에 와서 지하철을 탔을 때 최 박사는 깜짝 놀랐다고 했다. “다들 스마트폰을 보고 있더라. 그걸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너무 의존해도 안 된다. 그건 지식이다. 지식은 과거다. 우리가 사유하는 시간을 빼앗고, 사유하는 힘을 약화시킬 수도 있다. 거기에 잡아먹히면 곤란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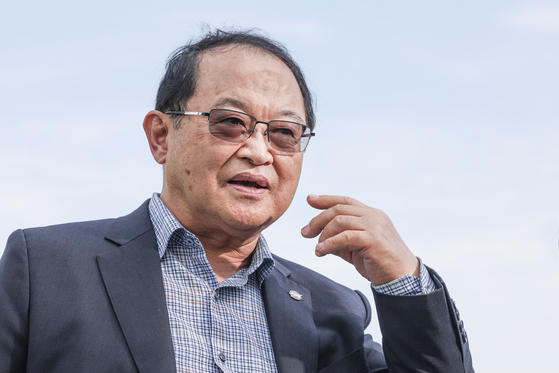
Q : 자신의 프레임을 깨는 일, 왜 필요한가.
A : “인간은 프레임에 갇히지 않을수록 자유롭다. 우주를 보라. 스케일이 어마어마하게 크다. 설령 우주에 대한 프레임이 있다고 해도, 프레임의 크기는 엄청나게 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우주를 바라볼 때 자유를 느낀다.”
Q : 인간이 우주에 대해 아는 건 기껏해야 5%에 불과하다. 이건 희망적인 건가, 절망적인 건가.
A : “희망적인 거다. 그만큼 할 일이 많다는 거다.”
최 박사는 리더십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다. “예전에는 자기 밑에 많은 사람을 거느리든지, 조직을 운영하는 걸 리더십이라고 불렀다. 현대의 리더십은 그렇지 않다. 자기 밑에 사람이 없어도 리더가 될 수 있다.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파워 오브 비전(Power of vision)’이다. 리더가 되려면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한다.”
최 박사는 과학자다. 그러면서도 신(神)을 믿는다. 과학과 신, 둘은 서로 충돌하지 않는 걸까.
Q : 과학이 발달하면 할수록 종교가 설 자리가 없어질 거라고 말한다. 어찌 보나.
A : “과학의 대상은 자연이다. 과학이 뭔가. 자연의 이치를 밝혀내는 일이다. 종교에도 이치가 있다. 인간이라는 존재의 근원과 실존에 대한 이치다. 우주의 모든 이치는 서로 통한다. 과학의 이치와 종교의 이치도 마찬가지다. 그러니 과학이 발달하고, 자연의 이치가 더 드러날수록, 종교의 이치도 더 많이 밝아질 수밖에 없다. 과학과 종교는 서로 충돌하는 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서로 밝혀주는 관계라고 본다.”

백성호([email protected])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