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셋 코리아] 재원도 없이 선심 공약 되풀이하는 대선

대선 때마다 포퓰리즘 공약 넘쳐
나랏빚만 부풀려 청년에게 전가
민간부문 생산성 회복이 더 중요
나랏빚만 부풀려 청년에게 전가
민간부문 생산성 회복이 더 중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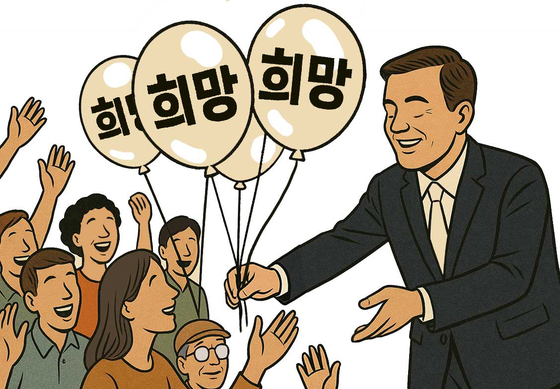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결코 새로운 일이 아니라는 데 있다. 2012년, 2017년, 2022년 대선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지적되었지만 개선된 바 없다. 당시에도 후보들은 수백조 원 단위의 공약을 남발했으나, 구체적 재원 조달 방안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래도 최소한 그때는 공약 이행에 필요한 총재원 규모라도 언론 등을 통해 별도로 제시되었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그마저 실종된 상태다.
예를 들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이재명 후보의 대표 공약인 ‘18세까지 아동수당 확대’에서 월 20만원을 지급한다면 연간 약 16조 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는 현재 약 2조 원 규모인 아동수당 예산의 8배에 해당한다. 김문수 후보가 주장한 전국 GTX 구축 공약도 수십조 원의 재원이 필요한 초대형 프로젝트다. 그러나 양측 모두 재정 투입의 규모나 확보 방안에 대한 실질적 설명은 전무하다.
이는 결국 국가 재정의 구조적 불균형을 야기하고, 후세대에 부채를 고스란히 전가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기준으로 총예산은 400조 원, 국세 수입은 242조 원, 국가채무는 682조 원(GDP 대비 40.4%)이었다. 그러나 2025년 현재 총예산은 673조 원으로 확대되고, 국세 수입은 382조 원으로 증가했으나, 국가채무는 1273조 원(GDP 대비 48.1%)에 달한다. 8년간 국세 수입은 140조 원 증가한 반면, 국가채무는 무려 591조 원이 늘어난 것이다. 이 같은 국가채무 중심의 기형적 재정 확대의 배후에는 결국 무분별한 공약 남발이 자리하고 있다.
가계라면 자녀가 아버지 채무를 상속 포기할 수 있지만 국가는 그럴 수 없다. 차세대는 국민으로서 국가채무를 거부할 수 없으므로 그대로 떠안게 된다. 이는 세대 간 형평성 문제는 물론 조세 저항과 사회적 불안정까지 야기할 수 있다.
특히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투자보다는 단기적인 소비 중심의 포퓰리즘 공약이 반복된다면 국가 재정은 지속 가능성을 상실하게 된다.
더 나아가 이번 대선 후보자들의 공약은 조세와 규제라는 국가 정책의 두 축은 거의 도외시하고 재정 지출 경쟁에만 치우쳐 있다. 즉 규제를 완화하고 조세를 개편하여 성장 인센티브를 유도하려는 전략보다는 복지 지출과 현금성 지원에 치중된 지출 중심 공약들이 대부분이다. 이것이야말로 선심성 공약의 경쟁이라 할 수 있다.
국가의 미래는 화려한 공약의 나열이 아니라 재정 운영의 지속 가능성과 민간부문의 생산성 회복을 통한 국가 경쟁력의 강화에 달려 있다. 지금 대선 후보에게 필요한 것은 유권자의 표심을 자극하는 장밋빛 구호가 아니라 정교한 재원 확보 방안을 제시하여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선거의 국민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며, 진정한 리더십이고 국가를 위한 최소한의 책무이다.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한국납세자연합회 명예회장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