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쌀 한말도 없던 독립운동가 후손, 그래도 임청각 지켜야했다 [독립의 얼 잇는 사람들]
━
이상룡 선생의 종손 이창수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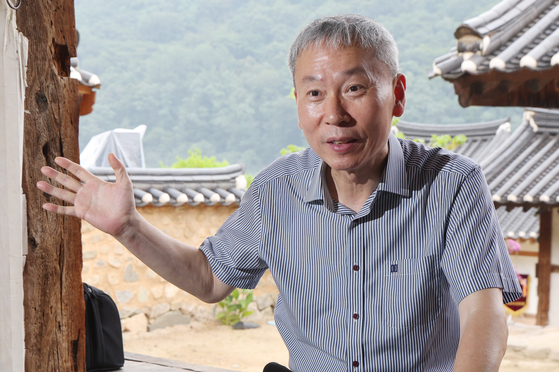
하지만 임청각에서 유년시절을 보낸 이창수(60)씨에게 임청각은 그저 지독한 가난 속에서 가족끼리 부대끼며 살아내야 했던 고난과 수모의 공간이었다. 고성 이씨 후예로 한때 99칸의 대저택이었던 임청각의 실질적 주인인 그가 어째서 이곳을 고통스러운 공간으로 기억하고 있는 걸까.
━
인생 첫 기억은 안동 오지 마을

지금으로 치면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는 국무령을 지낸 이상룡의 자손들이었지만, 고국에서는 쌀밥 한 번 제대로 먹기 어려운 삶을 살아야만 했다. 이씨의 숙부인 석주 선생의 증손자 이항증(86)씨가 쓴 『나는 임청각의 아들이다』에도 그런 얘기가 나온다. ‘광복 무렵 독립운동가 집안 대다수가 몹시 어려웠고 석주의 증손인 필자도 보육원을 전전하는 신세였다’라는 기록이다.
가난은 대를 잇고 이어져 이씨에게도 뼈아픈 기억들로 새겨졌다. 그는 “어머니가 하루는 깨밭에서 일하다 독사에 물려 팔이 퉁퉁 부었다. 그런데도 돈이 없어 병원을 못 가고 호박을 달여먹으며 죽을 고비를 넘겼다. 여동생도 머리에 주먹만한 혹이 생겨 머리카락이 다 빠지는 지경이었지만 병원 갈 돈이 없으니 아버지가 직접 칼로 혹을 찢어 고름을 짜냈다”고 말했다.

━
보육원 전전한 독립운동가 후손
한때 99칸 대저택이었던 임청각은 이상룡 후손들의 살림살이에 도움이 되긴커녕 오히려 짐이 될 뿐이었다. 소유권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재산의 역할을 하지 못한 데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는 데엔 도리어 방해가 됐다.

이씨는 “당시 동장이 우리 형편이 어려운 것을 알고 이른바 ‘영세민’으로 우리 가족을 등록해줬다. 영세민으로 등록되면 중고등학교 학비 면제가 되는데 못된 사람들이 ‘그렇게 집이 큰데 어떻게 영세민이냐’며 동사무소에 민원을 넣었다. 그 길로 영세민 등록이 취소됐다”고 했다.
이씨가 선조들의 독립운동을 직접 본 적은 없지만, 이들의 활약상은 평생에 걸쳐 전해 들었다. 이씨는 “1911년 석주 선생이 일가족을 이끌고 서간도로 넘어가 독립운동을 주도한 얘기나 석주 선생의 외아들인 동구 선생이 아버지의 유고를 정리한 후 ‘일제 치하에서 하루를 더 사는 것은 하루의 치욕을 더하게 될 뿐’이라는 유서를 남기고 자결하면서 항거한 역사를 부모에게 여러 차례 들었다”고 말했다.

석주 선생뿐 아니라 그의 생가인 임청각마저 오랜 오욕의 역사를 견뎌야만 했다. 일제가 일부러 임청각을 관통하는 철로를 만들어 임청각은 반 토막이 났고, 2020년 12월까지 하루 46번 열차가 집 앞을 오가는 소리를 들어야만 했다. 6·25 전후로는 안동철도국이 임청각을 노무자 합숙소로 쓴 일도 있다. 한동안 주인 없는 빈집이었던 임청각에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무단으로 거주한 일도 있었다고 한다. 선비정신과 호국정신의 상징적 공간이 폐가 취급을 받았던 셈이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이상룡 종가 후손은 임청각을 관리해 줄 사람을 찾았다. 그가 김호태(65) 안동문화지킴이 이사장이다. 이상룡 가문과 사돈의 연을 맺은 의성김씨 가문이라 그에게 부탁했다. 그는 10년 이상 지근거리에 머물며 임청각 관리는 물론 이곳을 찾는 방문객에게 임청각의 역사를 설명해주는 일을 하고 있다.

매년 공연을 관람한 이씨는 “지금에야 ‘독립운동’이라는 거창한 이름을 붙여 부르지만, 그때만 해도 모든 걸 버리고 만주 땅으로 떠나 끝 모를 고생하는 일이었다”며 “책으로 읽어서는 떠올릴 수 없는 당시 모습을 생생하게 눈으로 볼 수 있었던 공연”이라고 전했다.
━
‘이상룡 정신’ 잇기 위한 노력


그는 “이상룡 기념사업회 활동을 하면서 선대의 정신을 널리 알리고 있다”면서 “석주 선생이 1925년 9월 24일부터 이듬해 2월 18일까지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령을 역임했지만, 서훈등급은 3등급(독립장)에 불과해 이를 고치기 위한 노력에 집중하고 있다”고 했다.
이씨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반 8명 중 1등급으로 서훈된 사람은 이승만 대통령과 김구 선생 등 2명뿐이다. 헌법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초대 국무령을 지낸 석주 선생이 3등급에 서훈돼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김정석([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