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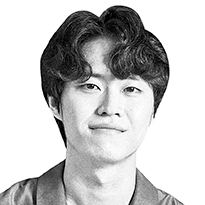
얼마 전 옛 취재원에게 이렇게 시작하는 장문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음주 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의 법제화에 앞장섰던 고(故) 윤창호 씨의 친구 A씨(29)였다. 3년 전 헌법재판소가 윤창호법에 위헌 결정을 내렸을 때 안타까워하던 그를 인터뷰했었다.
솔직히 메시지의 첫 문장만 보고선 무덤덤했다. 옛 취재원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제보 연락을 해오는 건 종종 있는 일이어서다. 하지만 바로 다음 문장을 읽고 머리를 세게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20대 여성 친구가 같은 고시원 주민인 40대 남성에게 살해당했다는 내용이었다.
![지난해 10월 열린 생명존중 캠페인 행사에서 참석자가 응원 메시지를 적고 있다. [뉴스1]](https://www.koreadaily.com/data/photo/2025/06/30/8c0ae885-1860-406f-94e8-0656db9804a5.jpg)
사인(死因)은 다르지만, 지난 21일 부산에서 유서를 남기고 함께 숨진 고교생 3명의 친구들과 유가족이 A씨와 겹쳐 보였다. 발인식에 참석한 학생 중엔 차마 친구의 관을 보지 못해 뒤돌아선 채 우는 이가 적지 않았다고 한다. 멀리서 죽음을 접한 사람들의 가슴도 먹먹한데 가까이서 희생자와 살을 맞대고 지낸 이들이 느꼈을 고통은 헤아리기도 어렵다.
사회학자인 엄기호 청강문화산업대 교수는 책 『고통은 나눌 수 있는가』에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발견하게 되는 것은 자신에게 언어가 없다는 사실이다. 그 고통이 예기치 못한 것일수록, 극단적인 것일수록, 그리고 외부로부터 온 가해의 결과일수록 더욱 그렇다”고 설명했다. 그렇게 말할 길이 끊어진 이들은 “세계로부터 단절되고 버림받는 파생적인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것이다.
국내 자살 사망자의 유가족 자살률이 일반인구 집단보다 20배 이상 높다(삼성서울병원 전홍진 교수 연구팀, 2022)는 사실은 우리 사회가 ‘남겨진 사람들’의 고통에는 둔감하다는 걸 의미한다. 희생자를 추모하고, 죽음의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만큼 중요한 건 남겨진 이들의 고통을 느끼고 응답하는 일이다.
━
박건([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