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초의 문자인 수메르 쐐기문자가 5000년 전쯤 생겼다니, 인류의 긴 시간에서 문자의 역사는 매우 짧은 편이다. 그런데도 뇌는 글자를 특별대접해서, 후두측두피질(시각 문자 형태 영역)에서 문자를 전담하게 했다. 뇌도 인정한 것이다. 문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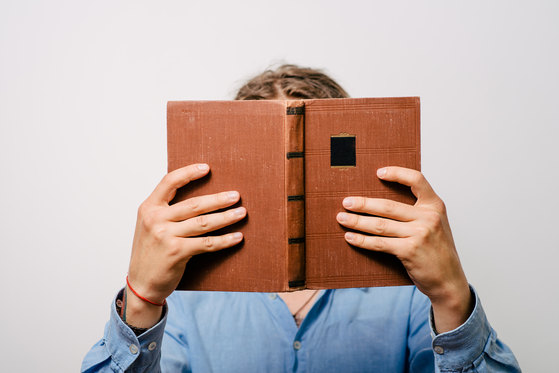
2024년 미국에서 대규모 종단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디지털 기기 앞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을수록 글 읽는 시간이 줄어들었으며, 단어 인식 능력이 떨어졌고, 시각 문자 형태 영역이 포함된 뇌 부위에서 회백질의 부피 감소가 발견되었다고 한다.
여담이지만 조만간 개봉하는 영화도 관람하려 한다. 원작의 독자로서 글의 작품이 어떻게 영상 작품으로 변화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또 다른 즐거움이니 말이다.
최훈 한림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