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통화정책방향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2.5%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는 금통위원 6명 전원 일치다. 한 차례 숨고르기하며 6ㆍ27 대출 규제 효과로 주택시장 과열이 진정되는지 지켜본 후 추가 금리 인하 시기와 폭을 결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인하의 발목을 잡은 건 고삐 풀린 서울 집값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금통위 후 기자간담회에서 “수도권에 집중된 집값 상승 속도가 지난해 8월보다 빠르다”며 “정도로 따지면 지금이 더 경계감이 심하다”고 했다. 한은은 지난해 8월에도 금리 인하로 경기 회복의 마중물을 부을 거란 시장의 기대를 꺾고 부동산 과열 우려를 앞세워 동결을 택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넷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43% 뛰었다. 2018년 9월 둘째 주(0.45%) 이후 6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이다.
![모든 금융권 가계대출 증감 추이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금융위원회]](https://www.koreadaily.com/data/photo/2025/07/11/11033784-6633-4f2f-b8d5-2656c57287de.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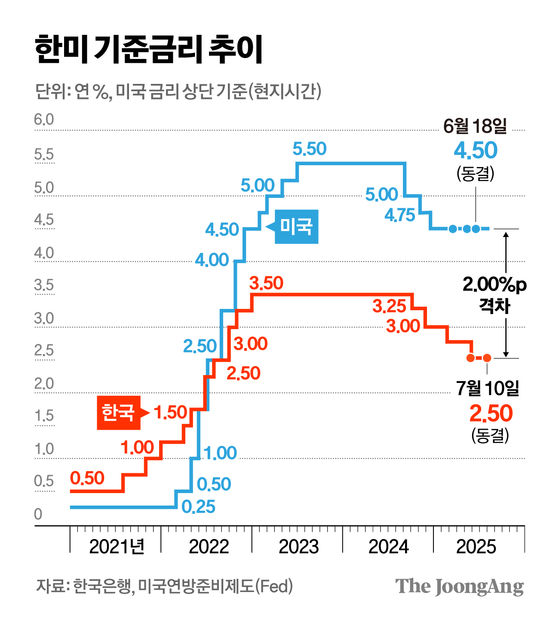
내수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금리 인하 타이밍을 놓치면 1%대 성장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총재는 지난 5월 전망 때보다 민간 소비가 개선되고 있지만, 건설 투자는 더 나빠졌다고 언급했다. 다만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3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집행으로 성장률 추가 둔화는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봤다. 한은은 이번 추경으로 올해 성장률이 지난 5월 전망치(0.8%)보다 0.1%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추산했다.
시장은 일단 8월 인하에 무게를 두고 있다. 금통위원 6명 중 4명도 3개월 내 인하 가능성을 열어뒀다. 다만 집값이 안 잡히고 관세의 부정적 영향은 커지는 최악의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이 총재는 “성장과 금융안정의 상충이 심해질 경우 어디에 더 무게를 두고 금리를 결정할지 고민하고 있다”며 “그렇게 된다면 금통위원들의 의견도 많이 나뉠 것”이라고 했다.
김경희([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