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재경의 마켓 나우] ‘원전 수소’에 신중한 EU, 속도 내는 한국

국내에서는 원전 수소의 경제성과 공급 안정성에 대한 관심이 높다. 특히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수입품의 탄소 배출량에 따라 비용을 부과함에 따라, 철강 산업용 청정 수소의 유력한 공급원으로 원전 수소가 부상하고 있다. 지난 6월 25일,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울산에서 추진 중인 원전 연계 청정 수소 실증 사업을 두고 “혁신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정책적 의지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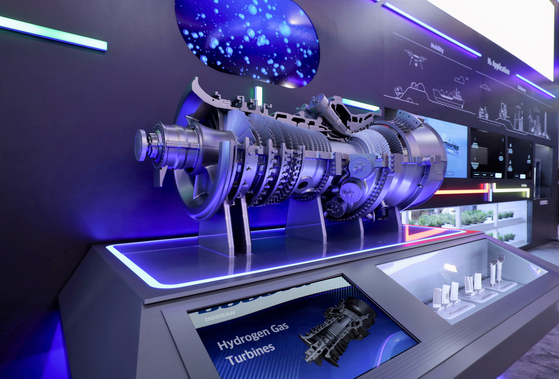
정책적 허점도 존재한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원전수소 27.5만t의 생산을 위해 기존 원자력 발전 전력을 수소 생산에 전용할 경우 석탄과 천연가스 발전의 가동 비중이 늘어나면서 연간 약 450만t의 온실가스가 추가로 배출될 수 있다. 이는 수소 1㎏당 약 16㎏의 온실가스가 새롭게 발생한다는 의미로, 청정 수소의 정의와 충돌한다.
그래서 기존 원전을 수소 생산에 전용하는 방식이 청정 수소의 정의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다.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실질적으로 확보하려면 기존 전력망과 분리된 독립형 원전이나 소형 모듈 원전(SMR)을 신규로 건설해 전용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정부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신규 원전 부지 선정 작업에 착수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원전의 안정성을 우려하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집권 이후에는 보다 실용주의적 노선을 택한 것으로 평가된다. 철강 산업의 탈탄소화를 위한 신규 원전 건설까지 이 실용주의 기조가 확대될지 주목된다.
김재경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