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가 리포트에 무분별 활용
AI 일상화의 역기능 대비해
창의성 살리는 통합교육해야
AI 일상화의 역기능 대비해
창의성 살리는 통합교육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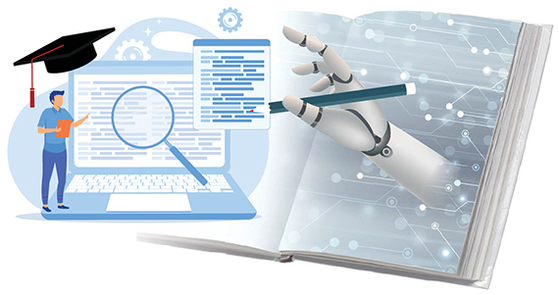
예를 들어 AI가 아주 쉽게 표절행위를 하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챗GPT와 같은 대형언어모델(LLM)이 과제 수행에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경우다. 지난 학기에 학생들이 제출한 리포트를 평가하면서 경험한 일이다. 과제는 커뮤니케이션(혹은 소통) 현상과 과정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와 이유에 대해 A4 한장 분량으로 작성하는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①자신이 선택한 요소(개념)를 설명하고②경험 사례를 포함하여 중요성을 정당화하고③참고자료(문헌·영화·음악 등)를 하나 이상 인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전개하는 거였다. 리포트를 읽으면서 느낀 점은 유사한 내용이 많고, 상당수는 표절 혐의를 벗어나기 어렵다는 거였다. 스스로 선택한 요소, 경험 사례, 참고자료가 여러 리포트에서 유사하거나 일치하는 경우가 있었다. 일부 리포트는 핵심 키워드, 내용, 주장에서 별 차별성이 없었다. 심지어 존재 여부가 의심스러운 참고문헌을 발견하고 확인 과정을 통해 가짜 정보임을 체험하기도 했다.
표절을 유혹하는 AI의 기술과 능력이 발전하는 속도를 고려하면 AI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을 서둘러야 한다. 박식한 AI가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하여 편집하는 수준이 아니라 자신의 아이디어·용어·스타일로 내용을 구성하고 해석하고 주장하는 통합적인 콘텐트를 만드는 능력을 키우는 교육이 필요하다. 하나의 재료가 아니라 여러 재료가 들어가야 좋은 음식을 만들 수 있듯이 AI가 주는 정보만으로는 신뢰할 수 있는 좋은 콘텐트를 만들 수 없다. AI의 생각대로 따르다 보면 자기 방식의 콘텐트를 만드는 생각과 능력은 사라진다. ‘창조적 사고’의 실뭉치로 ‘통합적 이해’의 직물을 짜는 교육(루트번스타인 & 루트번스타인, 『생각의 탄생』),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합리적인 이용을 위한 교육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 까닭이다. 상업적 목적의 AI 산업이 필연적으로 동반하는 AI의 오용과 남용에 대응할 수 있는 지혜는 AI 시대에 필요한 기본권이다.
인공지능 테크놀로지가 인간의 정보 생산, 가공, 유통, 이용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지금 기세라면 AI의 등장 이전과 등장 이후가 인간 공동체 이해에 변곡점이 될 듯싶다. 산업혁명이 전통사회의 인간에 대한 관점과 인간의 관계를 개인주의와 계약의 관계로 특징되는 현대사회로 변화시켰듯이 AI도 새로운 인간형과 공동체를 형성할 것이다. 인공지능의 기술 발전만이 아니라 AI의 일상화가 지니는 의미에 대한 인문학적 이해를 위한 교육체계를 갖추어 AI가 인간과 공동체에 도움을 주는 이용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함께이지만 혼자이고”(노리나 허츠, 『고립의 시대』), 진실과 거짓의 구분을 모호하게 한 소셜 미디어의 역기능을 반복하지 않고 AI와 인간이 협력하며 공존하는 세상으로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김정기 한양대 명예교수·커뮤니케이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