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예일대 정신의학과 나종호(42) 조교수는 “우리나라는 지금 ‘정신과 전성시대’”라고 말합니다. 정신과 의사 셀럽이 넘쳐나고, 정신과 의사의 사회적 영향력이 비대하게 커진 사회라는 의미죠.
나 교수는 “이건 좋은 징조가 아닌 것 같다”고 말합니다. “한국에 정신 건강 문제가 심각하다는 방증”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말도 덧붙였습니다. “제 SNS에 이런 악플이 달렸더라고요. ‘자살률 낮추면 너의 영향력은 낮아질 거’라고. 그런데 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 말이 전혀 의미가 없을 정도로 건강한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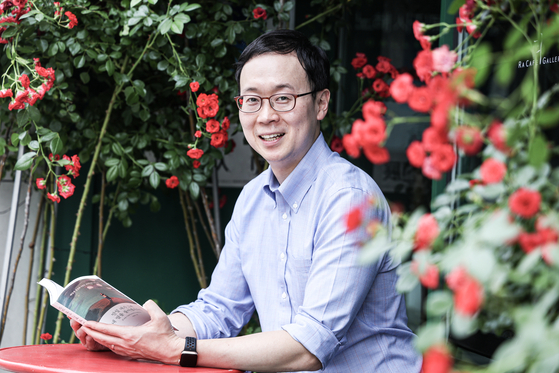
지난해 자살로 사망한 사람, 1만4439명. 하루에 약 4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인지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첫 국무회의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이 질문을 했죠. “우리나라 자살률이 왜 이리 높나요?”
이런 내용을 담았어요
📌 왜 한국은 자살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 왜 자살하면 안 되죠?
📌 고인에 대해 어떻게 말해야 하죠?
📌 “사실 저도 자살 이야기 하고 싶지 않아요”
📌 왜 자살하면 안 되죠?
📌 고인에 대해 어떻게 말해야 하죠?
📌 “사실 저도 자살 이야기 하고 싶지 않아요”
✅ 왜 한국은 자살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Q : 한국에서 사는 게 왜 이리 팍팍하고 힘들까요?
Q : “나 빼고 다 잘사는 것 같다”는 마음도 들어요.
Q : 교수님도 그런 적 있나요?
(계속)
나 교수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궁금증이 생깁니다. 왜 자살하면 안될까요? 자살을 막을 ‘골든타임’은 얼마나 될까요? 자살 유가족은 어떻게 대해야 하고, 한국의 높은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할까요? 인터뷰 전문은 아래 링크에서 이어집니다.
☞“왜 자살하면 안 되는 거죠?” 예일대 의사 답, 뜻밖이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50542
'더,마음' 기사를 더 보고 싶다면?
▶심리상담은 챗GPT가 최고다, 100만원 아끼는 5가지 기법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48814
▶“사악한 포주, 그게 나였다” 아내 절규한 남편의 과로자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46961
▶"넌 국민MC도 아니잖아" 이영자 묻자…김영철의 한마디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45026
▶“여보, 내 정력 옛날만 못해” 이런 중년 불륜 막을 한마디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39882
▶“난 죽어도 병원서 안 죽을래”…‘의사’ 엄마의 놀라운 유언장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38002
▶“나쁜 남자 망치에 맞아보라” 허무한 중년, 유혹하는 니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34448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48814
▶“사악한 포주, 그게 나였다” 아내 절규한 남편의 과로자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46961
▶"넌 국민MC도 아니잖아" 이영자 묻자…김영철의 한마디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45026
▶“여보, 내 정력 옛날만 못해” 이런 중년 불륜 막을 한마디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39882
▶“난 죽어도 병원서 안 죽을래”…‘의사’ 엄마의 놀라운 유언장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38002
▶“나쁜 남자 망치에 맞아보라” 허무한 중년, 유혹하는 니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34448
선희연([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