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왜곡된 예속의 구조는 수출 지표에 반영된다. 2023년 IT 서비스 수출은 95억 달러였으나, 패키지 소프트웨어 수출은 13억 달러에 불과했다. 한국은 제품보다는 인력을 투입한 ‘용역 개발’에 과도하게 의존하기 때문에 확장성과 수익성에 한계가 있다.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의 84%가 연 매출 50억 원 미만의 영세 기업이며, IT 서비스 분야의 연구개발 투자 증가율은 0.5%에 그친다. 혁신 대신 인건비 단가 경쟁만 남은 구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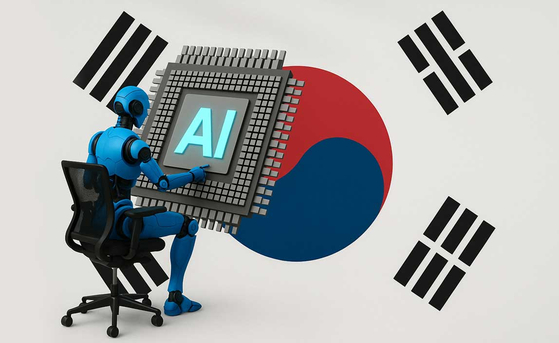
우리도 낡은 산업 구조를 탈피할 수 있다. 인공지능(AI)에 길이 있다. 범용 기술인 AI는 산업 전반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혁신하며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이끄는 기폭제다. 특히 AI 기능을 구독 형태로 제공하는 ‘서비스형 AI(AIaaS)’는 2025~2030년 연평균 36.8%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AI를 단순 용역이 아닌 ‘제품화된 소프트웨어’로 전환해야 글로벌 확장이 가능하다. 로봇이나 자율주행차조차 핵심은 탑재된 소프트웨어다.

이제 정치적 역량과 국가 자원을 소프트웨어 주권 확보에 집중하자. 제조업 중심주의에서 벗어나 AI 소프트웨어와 IT 서비스를 산업 전략의 최우선 순위에 둬야 한다. 이는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미래 경쟁력과 정체성의 문제다. 값싼 노동력에 의존하는 예속형 ‘하청 산업’의 그림자를 걷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다.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
이수화 서울대 빅데이터 혁신융합대학 연구교수·법무법인 디엘지 AI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