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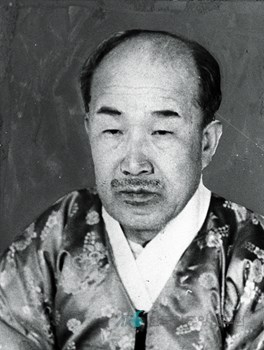
이 일화는 연세대 식구들 사회에서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이다. 내가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젊은 나이였고, 애들도 어린 터였는데도 깊은 감동을 받았는데 막상 내 자식들 혼인 때가 되니 두 분에 얽힌 얘기가 더욱 짙게 다가왔고, 자식의 혼인은 어떻게 치러야 하는 것인지, 교수가 수업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다짐할 때면 두 분 일화를 다시 되새기곤 했다.
확신하건대, 자녀들의 결혼에는 부모들이 마음을 바꿔야 하며, 특히 아들 둔 부모가 마음을 바꿔야 한다.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혼기를 놓치거나 마음 내키지 않게 헤어지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부모의 과도한 요구 때문이다. 아들 둔 게 유세이던 때는 지났다. 상견례에서 딸 둔 부모가 문간 쪽에 앉아야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나는 토할 것 같았다. 그래서 내 아들 장가갈 때 나는 사돈에게 “칫솔 하나만 보내시라” 했고 학과 교수는 물론 내 조교도 내 집 혼사를 몰랐다. 축의금도 받지 않았다. 자랑으로 들리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이 글을 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