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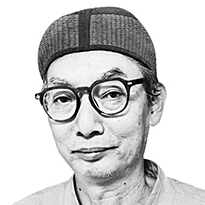
부탄에 관련된 책들을 읽던 중에 저널리스트이자 탐험가인 마이클 이스터의 『편안함의 습격』을 접하게 되었다. 저자는 ‘지금 당신은 편안함을 얻은 대가로 무엇을 잃었는가?’라는 물음을 앞세우며 현대 인류가 잃어버린 감각, ‘불편함’을 감수하며 살아가는 이들을 찾아가 인터뷰하여 그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 불편함의 감각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 돌올하게 살아 있는 부탄을 여행하며 그들이 누리는 행복한 삶의 근거가 무엇인지 밝힌다.
지상의 모든 존재 영원하지 않아
자연과 접촉 ‘죽음’ 인식에 도움
‘필멸 존재’ 깨달음, 행복에 영향
자연과 접촉 ‘죽음’ 인식에 도움
‘필멸 존재’ 깨달음, 행복에 영향

죽음을 대하는 태도가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 근대 서양철학의 대가인 마르틴 하이데거도 “만일 내가 죽음을 나의 삶 속으로 끌어와 인정하고 정면으로 바라본다면, 죽음에 대한 불안과 삶의 하찮음으로부터 나를 해방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럴 때 비로소 나는 자유롭게 나 자신이 될 것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사실 부탄 사람들의 ‘죽음 인식’은 하이데거보다 앞선 부탄의 국교인 불교의 근간에 이미 녹아 있다. 부탄의 불교 종파는 대부분의 여타 불교 국가들에 비해 죽음에 대한 각성을 더 강조한다. 다쇼 카르마 우라는 “부탄인들은 자신을 언제까지나 살아 있는 존재가 아니라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존재로 여긴다”고 말한다.
부탄 불교에서는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존재’를 ‘미탁파’(Mitakpa)라 부른다. ‘탁파’(Takpa)는 ‘영원’이란 말이고 ‘미’(Mi)는 ‘아니다’란 말로, 미탁파는 ‘영원하지 않다’는 뜻이다. 지상의 모든 존재는 ‘무상’하다는 말이다. 깨어 있는 부탄인들은 하루 세 번씩 자신이 ‘무상한 존재’라는 것을 되뇌인다고 한다.
그들에게 이런 죽음의 자각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은 자연과의 깊은 접촉이다. 지금도 부탄 국민의 약 70%가 시골에서 살아가고, 대부분의 사람은 흙과 돌과 나무 등 자연 소재로 지은 집에 거주하고, 농사지을 땅을 소유하고 있다. 험준한 산악 지형에 터를 잡고 살아가는 부탄인들에게 산비탈은 한 사람이 태어난 곳이고, 생계를 위해 일하는 곳이며. 자기가 성장하는 곳이자 결국 죽음을 맞이할 곳이다.
자연과의 접촉이 ‘죽음 인식’에 도움이 된다는 건 야생이 살아 있는 시골에 살고 있는 나 역시 깊이 공감한다. 얼마 전 등산을 하다 숲 그늘에 놓인 고라니의 주검을 보았다. 까마귀들에게 뜯어 먹혔는지 시신이 많이 훼손되어 있었다. 또 들고양이의 습격을 받은 새들의 사체도 마을에서 자주 눈에 띈다. 자연은 아름다운 공생만 아니라 죽음과 소멸의 모습도 품고 있는 것이다.
모든 피조물은 ‘변화의 낙인’이 찍혀 있다는 어느 수도승의 말처럼 우리는 생멸의 변화를 피할 수 없다. 부탄인들은 자신들이 필멸의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면 더 행복한 길을 따르게 된다고 믿는다. 더 나아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 생각했을 때 지금 경험하는 삶에 대해 감사하고 겸손한 존재가 된다고 한다.
오늘날 풍족한 먹거리와 의료기술의 발달로 기대 수명이 높아졌다. 그러나 장수나 불멸의 욕망보다 죽음이라는 숙명을 온전히 인식하는 일이 충만한 삶을 사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장차 다가올 나의 죽음을 생각하면 스스로 묻게 된다. 과연 나는 충분히 살아왔는가? 나는 충분히 사랑하고 있는가?
평생 목사로 활동하면서 나는 많은 이들의 임종을 지켜보았다. 그들 중 건강할 때 한 번도 죽음을 생각한 적이 없는 것을 후회하며 쉽게 눈을 감지 못하는 이가 적지 않았다. 그들이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며 깨어서 살았더라면 더 행복하고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았을까.
고진하 목사·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