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런 선택지는 존재하지 않았고,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은 경제뿐 아니라 생활양식과 에너지 소비 구조까지 뒤흔들었다. 필자가 『그린카 콘서트』(2011)에서 분석한 바에 따르면, 위기 이후 국민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기에 의존해 생활비를 줄일 수밖에 없었다. 겉으로는 ‘전기화’라는 현대적 진보처럼 보였으나, 실제로는 위기의 비용이 가계로 전가된 결과였다.
28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또 다른 선택의 갈림길과 마주한다. 비관적인 전망에 따르면, 미국 요구대로 3500억 달러의 직접투자와 1000억 달러 규모의 에너지 구매에 합의하면 금융위기에 버금가는 충격을 감수해야 한다. 거부하면 대미 수출에 관세 폭탄이 떨어져 산업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 특히 이번 투자가 기존 자본이 아닌 ‘신규’여야 한다는 점은 부담을 키운다. 이는 첨단 제조업과 신산업에 대한 국내 투자, 리쇼어링 전략을 재검토하게 하고, 더 나아가 지방 소멸과 양질의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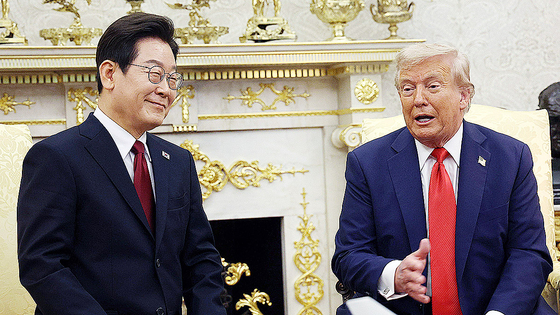
한국이 장기적으로 강대국이 되는 것이 최선이지만, 당장은 내부 분열로 스스로를 약화시키는 최악만은 피해야 한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김종필 총재의 진보·보수 연합이 경제 개혁의 원동력이 된 경험은 지금도 유효한 교훈이다. 이번 위기는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정치 개혁의 시험대다. 국가와 국민 모두가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점은 ‘전기화’ 당시와 마찬가지다. 문제는 정부가 이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설명하고 사회적 합의를 끌어낼 수 있느냐는 것이다. 실패한다면 이번에는 ‘차라리’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국가부도의 날을 맞게 될 지도 모른다.
박철완 서정대 스마트자동차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