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독] '노벨경제학상' 美 하윗 교수의 조언 "성장하고 싶다면 파괴하라"
![창조적 파괴가 경제성장 동력임을 정립,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하윗 교수. [AP=연합뉴스]](https://www.koreadaily.com/data/photo/2025/10/30/cd617f5f-fda4-4c66-bf1f-9e0114511eb7.jpg)
하윗 교수는 “한국은 수십 년 동안 이런 개방성을 유지했기 때문에 매우 성공할 수 있었다”고 진단했다. 이어 “현재와 같은 어려운 시기에도 한국은 계속 개방적이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여러 국가와의 무역 관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며 “다른 나라의 기술을 단순히 도입·활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최첨단 기술을 스스로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단순한 기술 모방이나 추격이 아닌, 연구·개발과 기업가정신이 주도하는 ‘창조적 성장’에 대한 주문이다.
하윗 교수는 브라운대에서 박사 과정을 밟은 하준경 대통령실 경제성장수석의 스승이다. 2007년 공동 논문(‘생산성과 연구·개발의 추세에 대한 회계 분석: 준내생적 성장 이론에 대한 슘페터식 비판’)도 발표했다. 하윗 교수의 발언에 대해 하 수석은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시장의 확대와 새로운 지식을 습득·확산하는데, 개방성이 중요하다는 의미”라며 “무역관계 조정이 필요하다면, 이러한 개방성의 이점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해석했다.
하윗 교수는 특히 혁신이 정체된 한국 상황과 관련 “산업은 기존 질서를 위협하는 ‘파괴적 혁신가’에게 열려 있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기존 산업의 기득권 세력이 새로운 기술의 수익 창출을 어렵게 만들어 혁신의 유인이 약화할 것”이라고 짚었다. 이와 관련 하 수석은 “한국의 산업 생태계가 상당히 경직적이고, 기업 순위도 고착화돼있다”며 “새로운 기업들이 진입해서 올라갈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술 탈취나 기업 간 불공정 행위는 억제하면서도 지식과 기술의 확산, 새로운 혁신기업의 창업 등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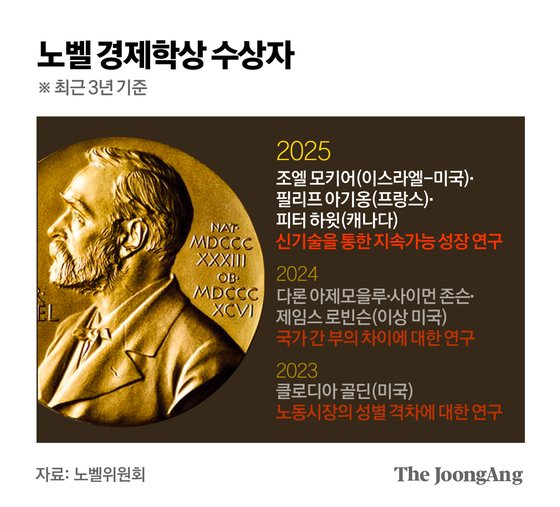
박유미([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