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국내외 증시의 상승 기세가 워낙 좋다 보니 최근 주가 조정을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추가 상승을 위한 에너지 재충전 과정’이라는 견해부터 ‘증시가 버블로 향해 가고 있다’라거나 ‘이미 거품이 꺼지고 있다’는 의견까지 나온다. 단기 주가 흐름이야 ‘미스터 마켓’(예측 불가능한 시장의 변덕) 소관이고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지만 투자자들은 ‘강세장 추세가 여전히 살아 있느냐, 아니면 이제부터 서서히 대세 하락을 준비해야 하느냐’를 두고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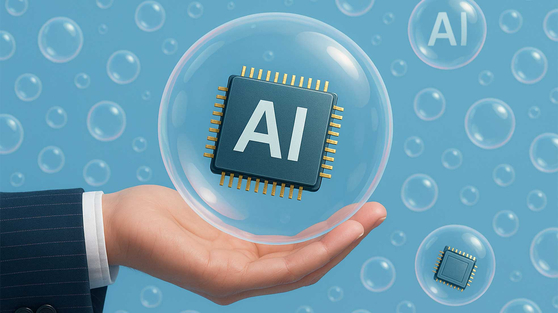
따라서 우리는 단지 지금까지 주가가 많이 올라 비싸졌다는 현상만 볼 것이 아니라, 시장의 진짜 동력이 무엇이고 그 엔진이 식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지금 주가 수준이 정말 비이성적이고 대중의 투자심리가 행복을 넘어 도취 상태는 아닌지를 면밀히 들여다봐야 한다. 국내 증시는 무엇보다도 반도체 산업의 동력이 관건인데, 이번 반도체 경기는 2000년 이후 6번째 호황으로 데이터센터 투자 붐 덕분에 2003년과 2016년의 사이클보다 훨씬 강하고 역동적이다. 미국 증시도 인공지능(AI) 관련 기업들의 이익과 마진율이 버텨준다면 지금의 주가를 버블로 보기는 어렵다.
김한진 삼프로TV 이코노미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