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공일 회고록 ①경제국정, 이랬다

두 총회는 주요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의 관심이 제3세계의 외채 위기와 그 해결책에 쏠려 있을 때 개최됐다. 당시 중남미 개도국과 아프리카, 그리고 일부 산유국들은 과도한 외채 상환 불능 위기에 처해 있었다. 이들 개도국의 외채 문제는 바로 돈을 빌려준 미국을 위시한 선진국 은행의 부실과 국제금융 체제의 불안으로 직결됐다. 채권 선진국의 ‘발등의 불’이었다. 이는 IMF와 세계은행의 큰 도전이기도 했다. 따라서 이 문제가 두 차례 총회의 핵심 의제가 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선·후진국이 함께 개도국 외채 상환 불능 문제로 고민하고 있었지만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에 이어 제3세계 4대 외채 보유국이었던 한국은 이와 반대로 외채 조기 상환 시책을 펴고 있었다. 86년부터 사상 처음으로 국제수지 흑자 시대를 맞아 우리나라는 그동안 쌓였던 외채 갚기에 나선 것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한국의 외채 조기 상환도 우리 뜻대로 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비 올 때 우산을 거둬가고, 비 갠 후에 우산을 빌려주려 한다”는 국제금융 시장의 냉혹한 현실에 부닥친 것이다. 돈 떼일 염려 없는 나라가 거꾸로 갚으려 하니 문제가 된 것이다. 당시 세계은행마저도 한국이 최소한의 차관 규모를 유지해 달라는 공식 요청을 하기도 했다. 마지못해 우리는 조건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외채를 ‘끼워팔기식’으로 불리한 조건의 외채와 함께 조기 상환한 경우도 있었다.
당시 세계 제2 경제 대국으로 미국을 제치고 세계 제1 채권국이 된 일본은 왜 국제무대에서 큰소리칠 수 없었나? 85년에 일본 엔화를 강제 절상시킨 플라자 합의(Plaza Accord)도 있었지만, 당시 미국에서는 일본 때리기(Japan bashing)가 한창이었다. 일본은 자국 시장은 개방하지 않은 채 무역 흑자만 챙기는 불공정한 나라로 내몰리고 있었다. 그래서 당시 일본은 국제무대에서 자기 방어에 급급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87년 9월 총회에서 아침 좋은 시간대에 연설하게 됐다. 단상에는 바버 코너블 세계은행 총재와 그해 초 취임한 미셸 캉드쉬 IMF 총재가 처음으로 총회 공동 사회자석에 앉아 있었다. 나는 세계경제 현안이 되고 있는 과중한 제3세계 외채 문제 해결을 위해 선·후진국이 각각 해야 할 일들을 강조했다. 우선 미국을 위시한 선진국들은 자국 산업 보호 명분으로 내세운 각종 보호무역주의 조치부터 지양해야 함을 강조했다. 모든 개도국의 외채 상환 능력 자체를 저해하기 때문이다. 만약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가 지속한다면 한국과 같은 외채 상환 모범국마저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환기시켰다.
이와 동시에 우리의 경험에 비춰 개도국 스스로 고통스러운 경제 구조조정 시책을 강력히 추진해야 함을 재삼 강조했다. 이를 도와주기 위해 채권 선진국과 IMF-세계은행, 그리고 일반 상업은행의 추가 지원과 협조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연설 후 휴식 시간에 마주친 코너블 총재는 나와 악수를 청하며 “눈을 번쩍 뜨게 하는(eye-opening) 특별한 연설”이었다고 축하했다. 옆에 있던 캉드쉬 총재도 머리를 끄덕였다. 나의 연설은 미국 베이커 장관 등 몇 안 되는 나라 장관 연설과 함께 방송 C-SPAN에서 생중계됐다고 나중에 들었다.
1년 뒤인 88년 9월 베를린에서 열린 IMF-세계은행 연차총회 때 기억도 생생하다. 이 총회에서도 87년에 이어 제3세계 외채 상환과 해결 방안이 주 관심사였다. 이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듯, 총회 기간 주로 유럽과 중남미 등 여러 국가에서 몰려온 5만여 명(당시 현지 언론 보도)의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다. 이들은 돌을 던지고 기물을 파손했다. IMF의 지나친 긴축과 무리한 구조조정을 철폐하고, 과중한 개도국 외채의 탕감과 말소를 요구하며 폭력 시위를 벌였다.
나는 베를린 교민회의 간절한 요청으로 회의 중 잠시 짬을 내어 교민회관을 방문했다. 이때 직접 시위대의 위협을 받은 적이 있다. 밖에 세워둔 자동차의 총회 참석 표지를 보고 일부 시위대가 몰려온 것이다. 총회장으로 돌아갈 수 없어 난감했다. 그래서 수행했던 재무부 차관보가 위험을 무릅쓰고 나갔다. 그가 자동차를 둘러싼 시위대와 승강이를 하는 틈에 나는 교민회관 뒷문으로 아슬아슬하게 빠져나왔다. 덕분에 총회장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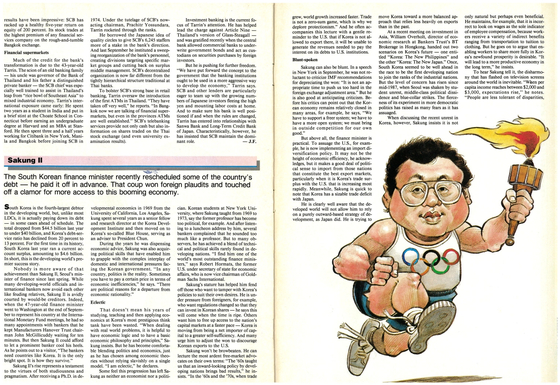
88년 베를린 총회 때도 인베스터지는 IMF-세계은행 총회 특별판에서 ‘한국의 사공일, 그를 만나려는 은행가들로 문전성시를 이루다’라는 제목의 글을 실었다. 그 기사에서 한국의 재무부 장관은 당시 총회의 스타 중 한 명으로 그의 문제는 오로지 ‘성공’에서 온 것이라고 치켜세웠다. 당시 한국은 물가 안정과 두 자릿수의 경제 성장, 그리고 경상수지 흑자라는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놀라운 경제적 성과를 내고 있었다. 경기 과열을 우려한 당시 정부는 두 자릿수의 성장세를 줄이기 위한 노력까지 하고 있다는 점을 적시한 것이다.
돌이켜보면 나는 정말 운이 따라준 ‘행복한 대한민국의 재무부 장관’이었다. 기라성 같던 많은 선배 장관들은 이러한 나와는 정반대였다. 돈을 빌리려는 입장에서 주요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 그리고 국제 금융계 인사들을 어렵사리 만나 아쉬운 소리를 했어야만 했기 때문이다.
또 장관 재임 시 유사시에 IMF로부터 단기 자금 인출을 위한 IMF의 스탠드바이(stand-by) 협정을 끝낼 수 있었다. 게다가 20년간 한국에 상주해 온 IMF 사무실도 87년 7월에 철수시킬 수 있었다(불행히도 10여 년 뒤에 ‘IMF 재수생’이 됐지만). 그리고 88년 총회에서 한국이 외환 경상거래 제한 등을 철폐하고 자본·외환 시장의 개방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IMF 8조국’으로서 의무를 다할 것을 선언했다.
이러한 배경 덕에 베를린 총회에서 한국은 차기(89년) 미국 워싱턴 총회의 의장국에 지명됐다. 총회 마지막 날 폐회식에서 나는 차기 의장국 수락 연설을 했다. IMF-세계은행 측에서는 다음 총회에도 당연히 내가 재무부 장관으로 참석할 것을 예상했었다고 사후에 들었다.
“행운은 노력과 기회가 만날 때 일어난다”는 로마 철학자 세네카의 명언이 있다. 이와 일맥상통하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의 전설적 프로 골퍼 개리 플레이어의 말을 나는 자주 인용한다. 그는 불리한 신체적 조건을 극복하기 위해 남다른 체력 보강 훈련과 함께 시합 전날까지 연습하는 노력형 선수로 잘 알려져 있다. 그는 그린 주변이나 벙커에서 친 공이 홀로 빨려 들어가는 등 운 좋게 우승한 적이 많았다. 어느 기자가 물었다. “어떻게 당신에게는 항상 운이 따르느냐”고. 플레이어는 담담하게 “연습을 많이 하니까 운이 따라주더라”고 답했다.
운은 준비한 자의 몫이다. 개인뿐 아니라 나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한국이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었던 것도 세계경제 3저(저유가·저금리·저달러)가 오기 전 경제 안정화와 기본 체질 강화로 국제경쟁력을 배양해 뒀기 때문이다.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나는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을 평생 좌우명으로 삼고 일해 왔다. 그리고 운이 따라준 것에 대해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살고 있다.
사공일([email protected] )
![스마트폰 카메라 앱으로 위 QR코드를 스캔하면 The JoongAng Plus에서 연재 중인 [사공일 회고록: 경제국정, 이랬다] 시리즈를 더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https://www.koreadaily.com/data/photo/2026/01/23/ec90791c-2e35-45f6-8827-2dbfd06ac56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