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논의는 이미 궤도에 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휴머노이드 도입을 둘러싼 노사 갈등과 관련해 “밀려오는 거대한 수레바퀴를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안전이 이익보다 중요하다. 조립 라인처럼 공정 밀도가 높은 환경에 휴머노이드를 투입하려면 ‘인간-로봇 상호작용(HRI)’에 대한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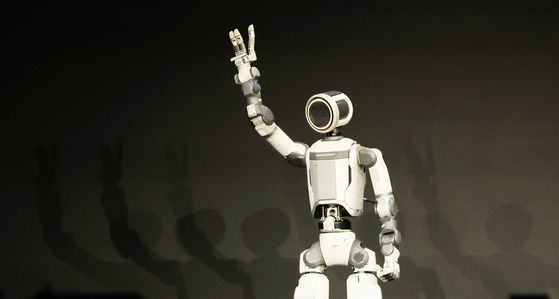
셋째, 자기 보호와 책임 소재. 시스템 보호를 이유로 가동을 중단했을 때 그로 인한 공정 손실의 책임 소재가 제조사인지 운용사인지 아직 불분명하다.
선결과제 해결이 중요하다. 도입 시점을 앞당길 것이 아니라, 안전 표준과 책임 체계를 먼저 확정해야 한다. 아시모프의 원칙을 추상적 선언에 그치지 않고 센서 정확도, 반응 속도, 비상 정지 메커니즘 같은 구체적 엔지니어링 요구사항으로 구체화해야 한다. 동시에 재교육·전직 지원과 데이터 관리 규범 등 노동 전환을 위한 보호장치도 병행돼야 한다. 기술이 준비됐다는 이유만으로 밀어붙이는 혁신은 갈등만 증폭시킨다.
첨단 휴머노이드는 로봇 청소기나 단순 서비스 로봇과는 차원이 다르다. ‘필요하다’는 사실이 ‘지금 투입할 수 있다’는 허가증은 아니다. 특히 인간과 로봇이 긴밀하게 상호작용하는 자동차 산업에서는 더욱 그렇다. 지금 한국 사회에 필요한 질문은 ‘언제’ 도입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안전하게 통제할 것인가다.
한국은 휴머노이드로 단순히 생산성을 높이는 나라에 머무를 것인가. 설계·제조·운영까지 전 생태계를 주도해야 노동 공백을 메우는 동시에 새로운 일자리와 수출 산업을 창출할 수 있다. 출발점은 기술 낙관론이 아니라 신뢰다. 기술을 안전하게 통제할 수 있다는 사회적 신뢰가 휴머노이드 시대에 더욱 중요해졌다.
박철완 서정대 스마트자동차학과 미래자동차석사과정 교수